아침을 여는 예배 (날.기.새)
지금도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같은 말로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바샤나 하바아 예루샬라임” 이 말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망향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울,다윗,솔로몬왕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윗쪽은 ‘(북)이스라엘’로, 아랫쪽은 ‘(남)유다’로 불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후로 남유다는 130여년 더 지속되었지만,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막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에 함께 끌려간 시인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발강(에스겔이 있었던 곳), 을래강(다니엘이 있었던 곳) 등의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울고 있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2절을 다같이
(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추억이 있는 나무입니다. 절기때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이 버드나무를 흔들며 축제를 벌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여러 강변에서 버드나무들을 볼 때마다 고향에서 보던 나무를 떠올렸을 것이고, 절기를 지킬 때에 그 가지를 꺾어서 즐거워했던 때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악기를 타지(연주하지) 않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형수가 교수형을 당할때 목이 달리는 것같이, 자신들의 처지가 교수형을 당하는 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은 시인의 자화상과 같고,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런 상황을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2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즐겁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의 의미입니다. 즉 “이곳 이방 땅에서는, 그저 유희 대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요구로는 결코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입니다. 이 고백을 뒤집으면, “하나님,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의 의미입니다. 즉 지난날에 그럴 수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대한 참회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다시 기억하기로 다짐합니다.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시인은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있는 수금을 타는 재능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의 다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를 저주하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7절은 에돔에 대한 저주입니다.
(7)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에돔은 A.D. 70년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8-9절은 바벨론에 대한 저주입니다.
(8-9) 멸망한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불과 47년 만인,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울며 조롱을 당하게 된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울며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성악가이다. 레코딩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천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은 단 두 장 밖에 없는데 카레라스가 바로 그 두 장의 주인공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이 41세로 백혈병으로 쓰려졌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하여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사전 연락도 없이 다가온 것은 죽음의 선고였다.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며 포기할 수 없었다. 그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호세는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치료를 받았다.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주었다.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다. 그의 공연 수익금을 모두 이곳으로 보내어졌다. 그는 고백한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시인의 눈물과 세상의 조롱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에 실패할때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부터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삶의 위기과 고난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않고 그 뼈아픈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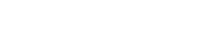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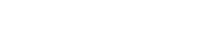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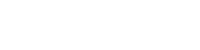
댓글